-
[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 AI 열풍 보도 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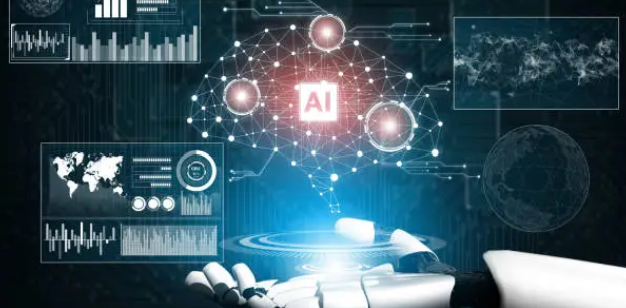
신문 기사체로 본 ‘AI 시대 충격’
《서울신문 1996년 5월 18일자 가상 보도》
“컴퓨터가 시를 쓰고 기사를 작성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른바 ‘인공지능 필경사(筆耕士)’가 등장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하던 글쓰기 직업군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안에 출판, 교육, 심지어 언론계까지 기계가 침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렇게 1990년대 신문 기사체로 오늘날의 AI 열풍을 묘사하면, 당시 독자들은 분명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컴퓨터’라 하면 사무용 워드프로세서나 오락실 게임기를 떠올리는 정도였고, 인간의 창의적 사고를 대신한다는 발상은 공상과학 소설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0년대 현재, 생성형 AI는 실제로 문장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음악을 만드는 단계까지 진입했습니다. 기자가 작성한 기사와 AI가 작성한 기사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으며, 대학생은 과제를 AI에게 맡기고, 직장인은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을 90년대식 문투로 다시 전하면, 당시 사람들이 가졌을 법한 불안감과 호기심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기사 속 표현 하나하나가 과장된 듯 보이지만,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AI가 바꿀 직업 세계와 사회상
1990년대 가상 기사체를 빌려 다시 적어봅니다.
“대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사원 평가와 채용 절차까지 맡게 될 것’이라며 ‘인간 사무직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또한 신문사 기자들 사이에서는 ‘기계가 기사를 작성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이 문장은 당시 신문에 실렸다면 다소 공상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AI가 실제로 채용 과정의 서류 평가, 업무 보고 자동화, 심지어 언론 기사 요약까지 담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 위기’라는 표현은 과거보다 훨씬 실감 납니다. 번역가, 작가, 교사, 상담가 등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영역을 AI가 대체하거나 보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AI는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데이터 큐레이터, AI 윤리 전문가와 같은 직종은 90년대 기사체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AI는 어떤 직업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90년대 신문 기사 문체로 현재를 서술하는 이유는 단순한 재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현재의 불안과 기대를 ‘과거의 시선’으로 비춰볼 때, 변화의 무게감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태도 – 1990년대식 교훈
마지막으로, 90년대 가상 사설 문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기계 문명의 물결 앞에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나 역사상 모든 기술 발전은 직업을 없애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인공지능 또한 그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잘 다스려 활용하는 길을 찾는 일이다.”
이 문장은 30년 전의 사설 같지만, 사실 오늘의 현실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AI를 거부하기보다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라면 AI를 단순한 ‘답안 제조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학습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보고서를 AI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AI가 제공하는 초안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분석을 덧붙여야 합니다. 창작자라면 AI의 결과물을 그대로 소비하기보다, 그것을 도구로 삼아 더 독창적인 작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신문 기사체는 우리에게 독특한 교훈을 줍니다.
그 시절 신문은 늘 미래 기술에 대해 경계와 기대를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역시, 과도한 불안 대신 현명한 수용과 창의적 대응입니다.
1990년대 신문 기사체로 재현한 AI 열풍 보도는, 과거의 언어로 오늘의 현실을 비춰보는 독특한 실험입니다.
“컴퓨터가 글을 대신 쓴다”는 표현은 30년 전에는 상상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패러디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새로운 기술 앞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불안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